부천에는 범바위산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고리울, 까치울에 걸쳐 있는 산이고, 다른 하나는 범박동에 있는 산이다. 이름은 똑같이 범바위산이다. 고리울, 까치울은 한자로 호암산(虎岩山)이라 하고, 범박동은 호랑바위산이라고 한다. 똑같은 의미이다.
부천하고 가까운 곳인 서울시 화곡 제5동에도 범바위가 있다. 이곳의 범바위는 ‘봉바위’라고 한다. ‘범’과 ‘봉’을 함께 쓰고 있다. 범하고 봉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다. 원촌말 뒷산에 범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
서울 동작구 흑석 제2동에도 범바위가 있다. 옛날 이곳에 한 낚시꾼이 잉어 한 마리를 낚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손을 내밀었다. 호랑이 손을 보고 질겁을 한 낚시꾼은 구멍이 뚫린 큰 바위 속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밖에서 두리번거리고만 있었다.
이 사람은 바위 속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호랑이가 손짓을 한 것은 단지 잉어를 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낚시꾼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고 꼼짝하지 않아 결국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범바위, 범바위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전국에 참으로 많은 범바위, 범바위산이 있다. 대부분 바위 모양이 범을 닮았거나 산 모양이 범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더러 사냥꾼이 범을 잡아 범바위산이라고 명명한 곳도 있다. 범새끼에 대한 설화도 많다. 범이 바위에 앉아서 쉬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곳도 있다.
원래는 범바위인데 부엉이가 앉은 바위라고도 불러서 벙바위로 부른 경우도 있다. 이곳에서도 ‘범’이 ‘벙’으로 바뀐 경우이다. 서울 종암동에선 범바위를 벙바위로 부른다.
우리네 선조들은 유난히 바위를 좋아했다. 그래서 바위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을 낳았다. 바위타령이라는 노래 속에 수많은 바위들이 등장한다.
범바위라는 땅이름을 쓴 곳이 전국에 23곳이나 된다. 북한까지 합치면 아주 많다. 산이 많은 지역인 북한이 더 많다.
그런데 이들 지역이 정말 호랑이하고 연관된 바위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호랑이와 연관 지어서 ‘호암(虎巖), 호동(虎洞), 범골, 호암산(虎巖山), 복호(伏虎)’ 등이 있다. 물론 예전 우리땅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고, 호랑이가 사람에게 친근한 영물이기도 해서 수많은 땅이름이 탄생한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범바위가 호랑이를 빗대서 탄생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까치울 의령남씨족보에는 의령남씨 선조들 중에서 ‘남연(南淵)의 묘는 호동(虎洞)에, 남종(南嵷), 남정규(南正圭), 남명섭(南命燮), 남대수(南大壽)의 묘는 호곡(虎谷)에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는 의령남씨족보가 출간된 년도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호동과 호곡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호동(虎洞)에서 ‘고을 동(洞)’은 고을을 의미하기도 하고,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선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니까 골짜기가 맞다. 그러므로 범골이라고 읽는다. 호곡(虎谷)도 우리말로는 범골이라고 읽는다.
사람들이 범골이라고 부른 것을 의령남씨족보에 기록할 때 한자로 호동, 호곡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호동, 호곡을 해석하면서 범골이라고 발음하는 것일까?
이는 당시에 사람들이 범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족보에 올리면서 호동(虎洞), 호곡(虎洞)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의령남씨족보에선 호동, 호곡으로 읽는다. 범골로는 읽지 않는다.
우리말 범골은 ‘붐골, 봄골, 봉골, 반골, 밤골, 방골, 뱀골’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들은 ‘크다, 신성하다’는 뜻의 ᄇᆞᆰ에서 출발한다. 이 ᄇᆞᆰ이 ‘범, 붐, 봄, 봉, 반, 밤, 방, 뱀’으로 분화했다. 그러니까 보통 뱀이 많이 나와서 뱀골이라고 하는데, 이는 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ᄇᆞᆰ이 어원인 ‘크게 벌어진 골짜기’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골짜기가 ‘크다’는 의미인 범인데, 이를 호랑이를 뜻하는 호(虎)로 옮겨 쓴 것이다.
한자로만 읽으면 호곡이나 호골이 되어 버린다. 이때 한자로 명기하지 않으면 호가 호랑이(虎)인지, 여우(狐)인지 알 수가 없다. 전국에 여우골을 호곡(狐谷)으로 쓴 곳이 많이 있다.
이처럼 범골이 호랑이가 살던 골짜기라는 의미까지 덧붙여진다. 아니 호랑이를 닮은 바위가 있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우리말을 한자로 옮겨 놓고 보면 그 뜻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져 버린다.
범고래, 범나비에서 ‘범’은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봉배산의 ‘봉’하고 그 뜻이 같다. 봉배산의 봉은 봉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설했다. 봉이 ‘크고 신성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바위의 중세언어는 바회이다. 고구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파의(巴衣), 파혜(波兮)이다. 고구려 때 서울 강서구의 이름은 제차파의현(齊次巴衣縣)이다. 이 이름에서 ‘파의’는 ‘바위’를 뜻한다. 재차(齊次)는 구멍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구멍바위가 된다. 이를 한자로 고쳐 쓰면서 공암(孔岩)이 되었다. 재차파의하고 공암은 발음부터가 다르다. 물론 뜻은 같다.
이렇게 파의가 바회로 바뀌었다가 바위로 굳었다. 이 바회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범바위에선 정말 바위(巖)를 가리키는 것일까? 범이 ‘봉’하고 같다면 뒤에 온 ‘바위’도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고리울 은행단지, 서울 신월동에 걸쳐 있는 범바위산에서 범은 ᄇᆞᆰ에서 온 말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낸다. 그러면 바위는 어디에서 온 말인지를 추적하면 된다.
먼저 바위에 대한 탯말을 추적해 보면 경기도 지역에선 ‘바웨, 방퀴’로 부른다. 전라도나 강원도에선 ‘바구, 바우, 방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천이 경기도에 속하니까 범바웨에나 범방퀴로 불러야 옳다. 표준어로 썼다고 해도 범바회가 된다. 오백년 전인 조선시대에 범바위를 우리말로 기록했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에 실린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들춰보자.
동해 연안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연오랑이 바다에서 해조를 따는데, 홀연 바위 하나가 나타나자, 이것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매, 사람들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여겨 왕으로 모셨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그를 찾는데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역시 그 바위에 올라타니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 왕에게 바치니 부부가 상봉하여 세오녀는 왕비가 되었다.
이 때부터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천문을 맡은 자가 아뢰어 말하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간 까닭에 이러한 변괴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돌아오게 하였으나 연오랑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나 나의 아내가 짠 가는 명주를 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하면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사신이 돌아와 아뢰고 그 말에 따라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옛날같이 빛났다. 그 명주를 어고에 두어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고,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이라 하였다.
이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를 보면 바위가 연오랑과 세오녀를 차례로 싣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정말 ‘바위, 바회, 암(巖)’이 두 사람을 실어 날랐을까? 그저 설화니까 가능한 얘기일까? 설화라고 해도 정말 바위일까? 그게 배는 아닐까?
누구라도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거나 건너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기에 배를 타고 오간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바위, 바회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구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바위와 배’를 발음하는 소리가 비슷했다는 것이다. 고구려 때 바위는 파의(巴衣)로 발음했고, 고려 때 송나라의 손목이 쓴 계림유사에선 배를 가리켜 파(擺)로 발음했다. 이로 미루어 파의, 바위, 바회를 배하고 같은 소리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신라까지 올라가보면 파의(巖)를 파(擺)로 읽어 배하고 똑같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위를 타고 일본을 오갔다는 말이 성립된다. 바위인 파의(巴衣)가 소리글로 배였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많은 범바위에서 때론 바위가 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부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 바위를 가리키는 말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범바위는 ‘범배’가 된다. ‘범’이 ‘봉’과 같이 읽을 수 있어서 ‘봉배’가 된다. 그러니까 ‘범배산, 봉배산’이 된다.
고리울, 까치울, 신월리에 걸쳐 있는 범바위산에 호랑이를 닮은 바위가 없음을 다들 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호랑이를 닮지 않음도 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범바위산이 호랑이와 무관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도훈 1961년 전남 나주의 농촌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역사, 문학 등을 좋아했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문학인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해 왔다.
부천에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89년도이다. 이때부터 책사랑 도서실 운영, 부천시민신문 기자, 부천실업학교 국어교사, 부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부천문화원 백일장 심사위원장,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부천이뉴스, 미추홀신문, 월간 사람과 사람들에서 편집인, 편집국장으로 일을 했다.
부천문화원 향토사 체험학습 강사를 하면서 부천지역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부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부천역사문화 해설사 과정에서 강사로 참여했고, 부천시 향토역사퀴즈왕 선발대회 총괄 주관을 맡기도 했다.
콩나물신문사 편집위원장으로 ‘내고향 부천이야기’ 연재를 했으며, 부천향토연구회 콩시루에서 부천역사 해설사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 인천작가회의 회원, 시와문화 작가회 회원, 시산맥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천 역사문화 관련 집필로는 ‘부천시사 땅이름 분야 집필’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 ‘신나게 부천을 배우자’ ‘장말도당굿’ ‘부천역사문화투어’ ‘고리울 가는 길’ ‘대장 마을 가는 길’ ‘대장 마을 사진집’ 등이 있다. 소설집으로 ‘벌거벗은 신들의 세상1, 2’가 있으며 동화로는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소라의 용못’ 등이 있다. 시집으로는 ‘오늘, 악어떼가 자살을 했다’ ‘홍시’ ‘코피의 향기’가 있다. 시와문화 신인상을 받았다.
부천하고 가까운 곳인 서울시 화곡 제5동에도 범바위가 있다. 이곳의 범바위는 ‘봉바위’라고 한다. ‘범’과 ‘봉’을 함께 쓰고 있다. 범하고 봉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다. 원촌말 뒷산에 범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
서울 동작구 흑석 제2동에도 범바위가 있다. 옛날 이곳에 한 낚시꾼이 잉어 한 마리를 낚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손을 내밀었다. 호랑이 손을 보고 질겁을 한 낚시꾼은 구멍이 뚫린 큰 바위 속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밖에서 두리번거리고만 있었다.
이 사람은 바위 속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호랑이가 손짓을 한 것은 단지 잉어를 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낚시꾼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고 꼼짝하지 않아 결국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범바위, 범바위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전국에 참으로 많은 범바위, 범바위산이 있다. 대부분 바위 모양이 범을 닮았거나 산 모양이 범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더러 사냥꾼이 범을 잡아 범바위산이라고 명명한 곳도 있다. 범새끼에 대한 설화도 많다. 범이 바위에 앉아서 쉬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곳도 있다.
|
원래는 범바위인데 부엉이가 앉은 바위라고도 불러서 벙바위로 부른 경우도 있다. 이곳에서도 ‘범’이 ‘벙’으로 바뀐 경우이다. 서울 종암동에선 범바위를 벙바위로 부른다.
우리네 선조들은 유난히 바위를 좋아했다. 그래서 바위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을 낳았다. 바위타령이라는 노래 속에 수많은 바위들이 등장한다.
|
바위타령
배고파 지어 놓은 밥에 뉘도 많고 돌도 많다. 뉘도 많고 돌 많기는 임이 안 계신 탓이로다. 그 밥에 어떤 돌이 들었더냐? 초벌로 새문안 거지바위, 문턱바위, 둥글바위, 너럭바위, 치마바위, 감투바위, 뱀바위, 구렁바위, 독사바위, 행금바위, 중바위, 동교로 북바위, 갓바위, 동소문 밖 덤바위, 자하문 밖 붙임바위, 백운대로 결단바위, 승갓절 쪽도리바위, 용바위, 신선바위, 부처바위, 필운대로 삿갓바위, 남산은 꾀꼬리 바위, 벙바위, 궤바위, 남문밖 자암바위, 우수재로 두텁바위, 이태원 녹바위, 헌다리 땅바위, 모화관 호랑바위, 선바위, 길마재로 말목바위, 감투바위, 서호정 용바위, 골바위, 둥그재로 배꼽바위, 말굽바위, 밧바위, 안바위, 할미바위, 수돌바위 하마바위, 애오개는 걸바위, 너분바위, 쌍룡정 거좌바위, 봉학정 벼락바위, 삼개는 벙바위, 고양도 벙바위 양천은 허바위, 김포로 돌아 감바위, 통진 붉은 바위, 인천은 석바위, 시흥 운문산 누덕바위, 형제바위, 삼신바위, 과천 관악산 염불암, 연주대로 세수 바위, 문바위, 문턱바위, 수원 한나루 영웅바위 돌정바위, 검바위, 광주는 서성바위, 이천은 곤지바위, 음죽은 앉을 바위, 여주 혼바위, 양근은 독바위, 황해도로 내려 금천은 설바위, 연안 건들바위, 서흥 병풍바위, 동설령 새남찍꺽바위, 과줄바위, 황주는 쪽도리바위, 평양 감영 장경문안 쇠바위, 덕바위, 서문 안의 안장바위 웃바위 순안은 실바위, 숙천은 허바위라 도로 올라 한양 서울 정토절 법당 앞에 개대바위,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흰 밥에 청대콩 많이 까둔 듯이 드문 듬성이 박혔더라 그 밥을 건목을 치고 이를 쑤시고 자세보니 연주문 돌기둥 한 쌍이 금니 박이 듯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눌은밥을 훑으려고 솥뚜껑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엉금 |
범바위라는 땅이름을 쓴 곳이 전국에 23곳이나 된다. 북한까지 합치면 아주 많다. 산이 많은 지역인 북한이 더 많다.
그런데 이들 지역이 정말 호랑이하고 연관된 바위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호랑이와 연관 지어서 ‘호암(虎巖), 호동(虎洞), 범골, 호암산(虎巖山), 복호(伏虎)’ 등이 있다. 물론 예전 우리땅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고, 호랑이가 사람에게 친근한 영물이기도 해서 수많은 땅이름이 탄생한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범바위가 호랑이를 빗대서 탄생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까치울 의령남씨족보에는 의령남씨 선조들 중에서 ‘남연(南淵)의 묘는 호동(虎洞)에, 남종(南嵷), 남정규(南正圭), 남명섭(南命燮), 남대수(南大壽)의 묘는 호곡(虎谷)에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는 의령남씨족보가 출간된 년도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호동과 호곡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호동(虎洞)에서 ‘고을 동(洞)’은 고을을 의미하기도 하고,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선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니까 골짜기가 맞다. 그러므로 범골이라고 읽는다. 호곡(虎谷)도 우리말로는 범골이라고 읽는다.
사람들이 범골이라고 부른 것을 의령남씨족보에 기록할 때 한자로 호동, 호곡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호동, 호곡을 해석하면서 범골이라고 발음하는 것일까?
이는 당시에 사람들이 범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족보에 올리면서 호동(虎洞), 호곡(虎洞)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의령남씨족보에선 호동, 호곡으로 읽는다. 범골로는 읽지 않는다.
우리말 범골은 ‘붐골, 봄골, 봉골, 반골, 밤골, 방골, 뱀골’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들은 ‘크다, 신성하다’는 뜻의 ᄇᆞᆰ에서 출발한다. 이 ᄇᆞᆰ이 ‘범, 붐, 봄, 봉, 반, 밤, 방, 뱀’으로 분화했다. 그러니까 보통 뱀이 많이 나와서 뱀골이라고 하는데, 이는 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ᄇᆞᆰ이 어원인 ‘크게 벌어진 골짜기’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골짜기가 ‘크다’는 의미인 범인데, 이를 호랑이를 뜻하는 호(虎)로 옮겨 쓴 것이다.
한자로만 읽으면 호곡이나 호골이 되어 버린다. 이때 한자로 명기하지 않으면 호가 호랑이(虎)인지, 여우(狐)인지 알 수가 없다. 전국에 여우골을 호곡(狐谷)으로 쓴 곳이 많이 있다.
이처럼 범골이 호랑이가 살던 골짜기라는 의미까지 덧붙여진다. 아니 호랑이를 닮은 바위가 있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우리말을 한자로 옮겨 놓고 보면 그 뜻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져 버린다.
범고래, 범나비에서 ‘범’은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봉배산의 ‘봉’하고 그 뜻이 같다. 봉배산의 봉은 봉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설했다. 봉이 ‘크고 신성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바위의 중세언어는 바회이다. 고구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파의(巴衣), 파혜(波兮)이다. 고구려 때 서울 강서구의 이름은 제차파의현(齊次巴衣縣)이다. 이 이름에서 ‘파의’는 ‘바위’를 뜻한다. 재차(齊次)는 구멍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구멍바위가 된다. 이를 한자로 고쳐 쓰면서 공암(孔岩)이 되었다. 재차파의하고 공암은 발음부터가 다르다. 물론 뜻은 같다.
이렇게 파의가 바회로 바뀌었다가 바위로 굳었다. 이 바회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범바위에선 정말 바위(巖)를 가리키는 것일까? 범이 ‘봉’하고 같다면 뒤에 온 ‘바위’도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고리울 은행단지, 서울 신월동에 걸쳐 있는 범바위산에서 범은 ᄇᆞᆰ에서 온 말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낸다. 그러면 바위는 어디에서 온 말인지를 추적하면 된다.
먼저 바위에 대한 탯말을 추적해 보면 경기도 지역에선 ‘바웨, 방퀴’로 부른다. 전라도나 강원도에선 ‘바구, 바우, 방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천이 경기도에 속하니까 범바웨에나 범방퀴로 불러야 옳다. 표준어로 썼다고 해도 범바회가 된다. 오백년 전인 조선시대에 범바위를 우리말로 기록했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에 실린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들춰보자.
| 東海濱有延烏郞細烏女夫婦而居 一日延烏歸海採藻 忽有一巖負歸日本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 乃入爲王 細烏怪夫不來歸尋之見夫脫鞋 亦上其巖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奉獻於王 夫婦相會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 日月之精降在我國今去日本 故致斯怪王遣使求二人 延烏曰 我到此國天使然也今何歸乎 雖然朕之妃有所織細 以此祭天可矣 仍賜其 使人來奏依其言而祭之然後日月如舊 藏其於御庫爲國寶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 |
동해 연안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연오랑이 바다에서 해조를 따는데, 홀연 바위 하나가 나타나자, 이것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매, 사람들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여겨 왕으로 모셨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그를 찾는데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역시 그 바위에 올라타니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 왕에게 바치니 부부가 상봉하여 세오녀는 왕비가 되었다.
이 때부터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천문을 맡은 자가 아뢰어 말하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간 까닭에 이러한 변괴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돌아오게 하였으나 연오랑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나 나의 아내가 짠 가는 명주를 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하면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사신이 돌아와 아뢰고 그 말에 따라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옛날같이 빛났다. 그 명주를 어고에 두어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고,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이라 하였다.
이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를 보면 바위가 연오랑과 세오녀를 차례로 싣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정말 ‘바위, 바회, 암(巖)’이 두 사람을 실어 날랐을까? 그저 설화니까 가능한 얘기일까? 설화라고 해도 정말 바위일까? 그게 배는 아닐까?
누구라도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거나 건너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기에 배를 타고 오간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바위, 바회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구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바위와 배’를 발음하는 소리가 비슷했다는 것이다. 고구려 때 바위는 파의(巴衣)로 발음했고, 고려 때 송나라의 손목이 쓴 계림유사에선 배를 가리켜 파(擺)로 발음했다. 이로 미루어 파의, 바위, 바회를 배하고 같은 소리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신라까지 올라가보면 파의(巖)를 파(擺)로 읽어 배하고 똑같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위를 타고 일본을 오갔다는 말이 성립된다. 바위인 파의(巴衣)가 소리글로 배였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많은 범바위에서 때론 바위가 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부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 바위를 가리키는 말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범바위는 ‘범배’가 된다. ‘범’이 ‘봉’과 같이 읽을 수 있어서 ‘봉배’가 된다. 그러니까 ‘범배산, 봉배산’이 된다.
고리울, 까치울, 신월리에 걸쳐 있는 범바위산에 호랑이를 닮은 바위가 없음을 다들 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호랑이를 닮지 않음도 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범바위산이 호랑이와 무관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부천에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89년도이다. 이때부터 책사랑 도서실 운영, 부천시민신문 기자, 부천실업학교 국어교사, 부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부천문화원 백일장 심사위원장,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부천이뉴스, 미추홀신문, 월간 사람과 사람들에서 편집인, 편집국장으로 일을 했다.
부천문화원 향토사 체험학습 강사를 하면서 부천지역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부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부천역사문화 해설사 과정에서 강사로 참여했고, 부천시 향토역사퀴즈왕 선발대회 총괄 주관을 맡기도 했다.
콩나물신문사 편집위원장으로 ‘내고향 부천이야기’ 연재를 했으며, 부천향토연구회 콩시루에서 부천역사 해설사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 인천작가회의 회원, 시와문화 작가회 회원, 시산맥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천 역사문화 관련 집필로는 ‘부천시사 땅이름 분야 집필’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 ‘신나게 부천을 배우자’ ‘장말도당굿’ ‘부천역사문화투어’ ‘고리울 가는 길’ ‘대장 마을 가는 길’ ‘대장 마을 사진집’ 등이 있다. 소설집으로 ‘벌거벗은 신들의 세상1, 2’가 있으며 동화로는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소라의 용못’ 등이 있다. 시집으로는 ‘오늘, 악어떼가 자살을 했다’ ‘홍시’ ‘코피의 향기’가 있다. 시와문화 신인상을 받았다.
ⓒ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 1이음플러스, "기후위기와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2차례 강연회"
- 2시루작은도서관, 부천평생교육사협회와 도서관 운영업무 위탁 협약
- 3[박병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 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 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 4'시루작은도서관 초등 아이돌봄교실' 참여아동을 모집합니다.
- 5사협) 이음플러스, 숭의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 6시루작은도서관, 숭의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 7시루작은도서관, 2023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선정
- 8이음플러스 심리상담센터, 2023년 1월 특별교육 일정
- 9부천 민문연, 사진작가 로저 셰퍼드 초청 강연회 열어
- 10로저셰퍼드 작가의 백두대간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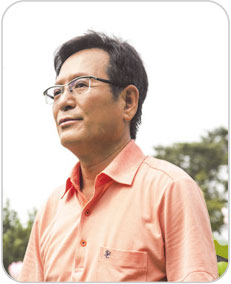

![[박병규 칼럼] 성매매알선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처벌법상 무죄](/pds_update/news/img1_20240529082535.jpg)
![[부천역사 한꼭지] 부천군수 출신 친일파 김태석(金泰錫, 金林泰錫)](/pds_update/news/img1_202311151144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