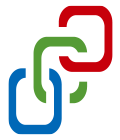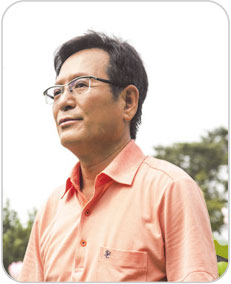고리울 청동기 유적공원에서 찬우물을 거쳐 언덕에 오른다. 동쪽에 솟대동산이 있다. 적석환구유구가 소도의 원형(原形)이기에 이 솟대공원은 그 의미가 소중하다.
아주 작은 움집을 재현해 놓았지만 너무 초라하다. 강화도 부근리 청동기 움집을 재현해 놓은 것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잘 알 수 있다. 그 옆에 청동기 인들을 재현해 놓고 두 마리 멧돼지를 쫓는 형상도 만들어 놓았다. 한 명은 돌멩이를 들었고, 다른 한명은 나무창을 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상체(上體)는 옷을 입지 않았고 하체(下體)만 가리고 있다.
청동기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가? 봉배산 주거지에선 옷감을 짤 수 있는 가락바퀴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겨우 하체만 가리는 옷을 지었을까? 청동기인들도 제대로 된 옷을 입었다. 그런데 너무도 원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돌화살촉도 있고 돌도끼도 있는데 어떻게 나무창으로 멧돼지를 잡을 생각을 했을까?
옆에 고인돌도 재현해 놓았다. 청동기인의 족장의 무덤이 고인돌이기는 하다. 조금 엉뚱하다. 그 위로 철쭉밭을 조성해 놓았다. 오월이면 철쭉꽃이 피어 화려한 공원을 뽐낸다.
철쭉꽃길을 따라 왼쪽으로 걷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산길을 잡아 봉배산 산자락으로 오른다. 낮은 산언덕에 조금 못 미쳐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봉배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렇다면 왜 여기다 운동기구를 설치했을까? 단지 공원이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인가?
이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이 바로 봉배산 제13호 움집 자리이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이곳에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움집 자리는 훼손이 되었을 성 싶다. 이 움집은 봉배산에서 가장 큰 집이다. 나중에 이 움집을 복원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여기가 움집 제13호 자리라고 표지판이라도 세워놓아야 옳은 것 아닌가!
중간 산등성이로 올라가면 사거리 산길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길이어서 반질반질 윤이 나 있다. 이곳에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주거지가 있다. 물론 예전처럼 땅속에 묻혀 있다. 유물들을 다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었다. 유물들만 출토하면 다 되는 것인가?
제1호 움집에는 철쭉꽃을 심어놓고 나머지 주거지는 그냥 방치해 놓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산길일 뿐이다.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좋으련만... 제2호 주거지도 바로 곁에 있다. 제6호 주거지는 천신제를 지내는 마당에 있다. 그 마당 동쪽 끝자락이 제8호 제9호 자리이다. 이 자리엔 청동기 유적에 대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다만 이 일대에 제1호 주거지 모형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고, 적석환구유구 모형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천신제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일년에 한번 천신제를 지내는 제례의식을 행하면 그뿐이다.
제7호 주거지는 동북쪽 산등성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에도 쉼터자리가 되어 의자가 놓여져 있다. 안내 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다시 남쪽으로 걸어와서 경인고속도로 건너는 구름다리를 넘어가면 봉배산 꼭대기가 나온다. 이곳이 적석환구유구이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30미터쯤 가면 칡넝쿨이 덮여 있는 공터가 나온다. 제10호, 제11호, 제12호가 있고, 그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가 몰려 있다. 햇빛이 잘드는 남쪽이기도 해서 거주지로서는 명당자리임에 틀림없다. 청동기인들도 본능적으로 명당자리를 찾아 움집을 세웠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봉배산 남쪽 아래쪽에 제21호가 있다. 이곳엔 나무들이 새로 심어져 있다. 아마도 유적지를 덮는 작업인 것 같다. 그냥 공터로 놓아두기에는 아까웠는지 유적발굴이 지난 뒤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이다.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는 유리관으로 보호하고 있다. 물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관람 동선을 만들어 놓았다. 이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이 유적지를 보러 온다. 학생들 역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왜 부천은 그런 노력이 가능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움집터라는 장소 안내판이라도 세워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도훈 1961년 전남 나주의 농촌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역사, 문학 등을 좋아했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문학인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해 왔다.
부천에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89년도이다. 이때부터 책사랑 도서실 운영, 부천시민신문 기자, 부천실업학교 국어교사, 부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부천문화원 백일장 심사위원장,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부천이뉴스, 미추홀신문, 월간 사람과 사람들에서 편집인, 편집국장으로 일을 했다.
부천문화원 향토사 체험학습 강사를 하면서 부천지역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부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부천역사문화 해설사 과정에서 강사로 참여했고, 부천시 향토역사퀴즈왕 선발대회 총괄 주관을 맡기도 했다.
콩나물신문사 편집위원장으로 ‘내고향 부천이야기’ 연재를 했으며, 부천향토연구회 콩시루에서 부천역사 해설사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 인천작가회의 회원, 시와문화 작가회 회원, 시산맥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천 역사문화 관련 집필로는 ‘부천시사 땅이름 분야 집필’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 ‘신나게 부천을 배우자’ ‘장말도당굿’ ‘부천역사문화투어’ ‘고리울 가는 길’ ‘대장 마을 가는 길’ ‘대장 마을 사진집’ 등이 있다. 소설집으로 ‘벌거벗은 신들의 세상1, 2’가 있으며 동화로는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소라의 용못’ 등이 있다. 시집으로는 ‘오늘, 악어떼가 자살을 했다’ ‘홍시’ ‘코피의 향기’가 있다. 시와문화 신인상을 받았다.
|
아주 작은 움집을 재현해 놓았지만 너무 초라하다. 강화도 부근리 청동기 움집을 재현해 놓은 것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잘 알 수 있다. 그 옆에 청동기 인들을 재현해 놓고 두 마리 멧돼지를 쫓는 형상도 만들어 놓았다. 한 명은 돌멩이를 들었고, 다른 한명은 나무창을 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상체(上體)는 옷을 입지 않았고 하체(下體)만 가리고 있다.
|
청동기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가? 봉배산 주거지에선 옷감을 짤 수 있는 가락바퀴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겨우 하체만 가리는 옷을 지었을까? 청동기인들도 제대로 된 옷을 입었다. 그런데 너무도 원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돌화살촉도 있고 돌도끼도 있는데 어떻게 나무창으로 멧돼지를 잡을 생각을 했을까?
|
옆에 고인돌도 재현해 놓았다. 청동기인의 족장의 무덤이 고인돌이기는 하다. 조금 엉뚱하다. 그 위로 철쭉밭을 조성해 놓았다. 오월이면 철쭉꽃이 피어 화려한 공원을 뽐낸다.
철쭉꽃길을 따라 왼쪽으로 걷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산길을 잡아 봉배산 산자락으로 오른다. 낮은 산언덕에 조금 못 미쳐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봉배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렇다면 왜 여기다 운동기구를 설치했을까? 단지 공원이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인가?
|
이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이 바로 봉배산 제13호 움집 자리이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이곳에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움집 자리는 훼손이 되었을 성 싶다. 이 움집은 봉배산에서 가장 큰 집이다. 나중에 이 움집을 복원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여기가 움집 제13호 자리라고 표지판이라도 세워놓아야 옳은 것 아닌가!
중간 산등성이로 올라가면 사거리 산길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길이어서 반질반질 윤이 나 있다. 이곳에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주거지가 있다. 물론 예전처럼 땅속에 묻혀 있다. 유물들을 다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었다. 유물들만 출토하면 다 되는 것인가?
제1호 움집에는 철쭉꽃을 심어놓고 나머지 주거지는 그냥 방치해 놓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산길일 뿐이다.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좋으련만... 제2호 주거지도 바로 곁에 있다. 제6호 주거지는 천신제를 지내는 마당에 있다. 그 마당 동쪽 끝자락이 제8호 제9호 자리이다. 이 자리엔 청동기 유적에 대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다만 이 일대에 제1호 주거지 모형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고, 적석환구유구 모형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천신제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일년에 한번 천신제를 지내는 제례의식을 행하면 그뿐이다.
제7호 주거지는 동북쪽 산등성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에도 쉼터자리가 되어 의자가 놓여져 있다. 안내 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다시 남쪽으로 걸어와서 경인고속도로 건너는 구름다리를 넘어가면 봉배산 꼭대기가 나온다. 이곳이 적석환구유구이다.
|
이곳에서 남쪽으로 30미터쯤 가면 칡넝쿨이 덮여 있는 공터가 나온다. 제10호, 제11호, 제12호가 있고, 그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가 몰려 있다. 햇빛이 잘드는 남쪽이기도 해서 거주지로서는 명당자리임에 틀림없다. 청동기인들도 본능적으로 명당자리를 찾아 움집을 세웠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봉배산 남쪽 아래쪽에 제21호가 있다. 이곳엔 나무들이 새로 심어져 있다. 아마도 유적지를 덮는 작업인 것 같다. 그냥 공터로 놓아두기에는 아까웠는지 유적발굴이 지난 뒤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이다.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는 유리관으로 보호하고 있다. 물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관람 동선을 만들어 놓았다. 이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이 유적지를 보러 온다. 학생들 역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왜 부천은 그런 노력이 가능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움집터라는 장소 안내판이라도 세워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부천에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89년도이다. 이때부터 책사랑 도서실 운영, 부천시민신문 기자, 부천실업학교 국어교사, 부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부천문화원 백일장 심사위원장,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부천이뉴스, 미추홀신문, 월간 사람과 사람들에서 편집인, 편집국장으로 일을 했다.
부천문화원 향토사 체험학습 강사를 하면서 부천지역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부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부천역사문화 해설사 과정에서 강사로 참여했고, 부천시 향토역사퀴즈왕 선발대회 총괄 주관을 맡기도 했다.
콩나물신문사 편집위원장으로 ‘내고향 부천이야기’ 연재를 했으며, 부천향토연구회 콩시루에서 부천역사 해설사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 인천작가회의 회원, 시와문화 작가회 회원, 시산맥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천 역사문화 관련 집필로는 ‘부천시사 땅이름 분야 집필’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 ‘신나게 부천을 배우자’ ‘장말도당굿’ ‘부천역사문화투어’ ‘고리울 가는 길’ ‘대장 마을 가는 길’ ‘대장 마을 사진집’ 등이 있다. 소설집으로 ‘벌거벗은 신들의 세상1, 2’가 있으며 동화로는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소라의 용못’ 등이 있다. 시집으로는 ‘오늘, 악어떼가 자살을 했다’ ‘홍시’ ‘코피의 향기’가 있다. 시와문화 신인상을 받았다.
한도훈
<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