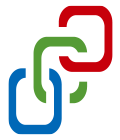лҢҖмһҘ л§Ҳмқ„кіј 섬л§җ мӮ¬мқҙм—җ мһ‘мқҖ кіөк°„мқҙ мһҲлӢӨ. лҢҖмһҘлҸҷ ліөм§ҖнҡҢкҙҖмңјлЎң л“Өм–ҙк°ҖлҠ” кёёлӘ© м–ём ҖлҰ¬м—җ мЈјм°ЁмһҘмңјлЎң м“°лҠ” кіімқҙлӢӨ.
мҳҲм „м—” мқҙкіім—җ к°ңмҡёмқҙ мһҲм–ҙм„ң лӮҳл¬ҙлӢӨлҰ¬(жңЁж©Ӣ)к°Җ лҶ“м—¬м ё мһҲлҚҳ кіімқҙлӢӨ. лҢҖмһҘлҸҷ ліөм§ҖнҡҢкҙҖ мң„мӘҪм—җм„ң к°ңмҡёл¬јмқҙ нқҳлҹ¬лӮҙл ӨмҷҖ кі лҰ¬мҡёлӮҙлЎң н•©лҘҳн–ҲлӢӨ.
мЈјм°ЁмһҘ л’Өмј м—җ м•„мЈј мһ‘мқҖ кі лһ‘мқҙ л§Ңл“Өм–ҙм ё мһҲлӢӨ. лӮҳл¬ҙл“ӨлҸ„ мӢ¬м–ҙм ё мһҲм–ҙм„ң мӮ¬лһҢл“Өмқҳ мӢңм„ м—җм„ң лІ—м–ҙлӮ мҲҳ мһҲлӢӨ. нҳёл°•л„қмҝЁмқҙ лӮҳл¬ҙл“Өмқ„ нғҖкі мҳӨлҘҙлҠ” кІғмқ„ м ңмҷён•ҳкі лҠ” лӢӨлҘё кІғл“ӨмқҖ л¬ҙмӢ¬нһҲ к·ём Җ кұ°кё°м—җ мһҲлӢӨ.
мқҙкіі мӣ…лҚ©мқҙм—җм„ң л§Өл…„ лҙ„мқҙл©ҙ 맹кҪҒмқҙмқҳ мҡёл¶Җм§–мқҢмқҙ мӢңмһ‘лҗңлӢӨ. м•”м»·мқ„ м°ҫм•„ лӘ©мІӯ н„°м ёлқј мҷём№ҳлҠ” 맹кҪҒмқҙл“Өмқҳ мІҳм Ҳн•ң мӮ¬нҲ¬к°Җ мӢңмһ‘лҗҳлҠ” кІғмқҙлӢӨ.
м§Җк·№нһҲ мўҒмқҖ кіөк°„м—җм„ң м•”м»· н•ҳлӮҳлҘј л‘җкі лЁјм Җ м°Ём§Җн•ҳкё° мң„н•ҙ л§№л ¬н•ҳкІҢ мҡёмқҢмқ„ мҡём–ҙлҢҖлҠ” кІғмқҙлӢӨ. м•„лӢҲ м•”м»·мқ„ л¶ҖлҘҙлҠ” мӮ¬лһ‘мқҳ мҶЎк°Җ(й ҢжӯҢ), мӮ¬лһ‘мқҳ м„ёл ҲлӮҳлҚ°мқҙлӢӨ.
“맹꼬мҳ№, 맹꼬мҳ№!”
мқҙл ҮкІҢ к·ңм№ҷм ҒмңјлЎң мҡём§Җ м•ҠлҠ”лӢӨ. мҲҳм»· н•ң лҶҲмқҙ 맹맹 кұ°лҰ¬л©° мҡҙлӢӨ. к·ёлҹ¬л©ҙ кіҒм—җ мһҲлҠ” лҶҲл“ӨлҸ„ мқҙм—җ л’Өм§Ҳм„ёлқј 맹맹 кұ°лҰ¬л©° мҡҙлӢӨ. н•ң лҶҲмқҙ кҪҒкҪҒмңјлЎң мҡёмқҢмқҳ мқҢмқ„ л°”кҫјлӢӨ. м•”м»·мқ„ мң нҳ№н•ҳкё° мң„н•ҙ лӢӨм–‘н•ң мҡёмқҢмңјлЎң лӢӨк°Җм„ңлҠ” кІғмқҙлӢӨ. к·ёлҹ¬л©ҙ м§ҖмІҙм—Ҷмқҙ лӢӨлҘё лҶҲл“ӨлҸ„ кҪҒкҪҒкұ°лҰ°лӢӨ. мқҙл ҮкІҢ 맹맹과 кҪҒкҪҒмқ„ лІҲк°Ҳм•„к°Җл©° л°ӨмғҲмӣҢ мҡҙлӢӨ. м№ҳм—ҙн•ң мӮ¬лһ‘мӢёмӣҖмқҙлӢӨ.
мЎ°м„ мӢңлҢҖ л•Ңмқҳ 맹мһҗ мҷҲ кіөмһҗ мҷҲ мұ… мқҪлҠ” мҶҢлҰ¬мҷҖ лҳ‘к°ҷлӢӨ. л§Ҳмқ„л§ҲлӢӨ м–‘л°ҳ집м—җм„ңлҠ” мқҙл ҮкІҢ 맹кҪҒмқҙмІҳлҹј мұ… мқҪлҠ” мҶҢлҰ¬к°Җ мҡ”лһҖн–ҲлӢӨ. 맹кҪҒмқҙ м„ңлӢ№мқҙлқјлҠ” л§җмқҙ кҙңнһҲ мғқкІЁлӮң кІғмқҖ м•„лӢҲлӢӨ. 맹кҪҒмқҙмІҳлҹј мҷҒмһҗм§Җк»„н•ҳкІҢ кёҖмқ„ мқҪм—Ҳкё°м—җ к·ёкұё н’Қмһҗн•ҙм„ң мғқкІЁлӮң кІғмқҙм—ҲлӢӨ. м„ңлҜјл“Өмқҙм•ј н•ҳлЈЁ мқјкіјмқҳ н”јкіӨм—җ кіЁм•„ л–Ём–ҙм ё м„ёмғҒлӘЁлҘҙкі кҝҲлӮҳлқјлҘј н—Өл§Өм—Ҳмқ„ н„°мқҙм§Җл§Ң...
лҙ„мқҙл©ҙ лҢҖмһҘ л§Ҳмқ„ мӮ¬лһҢл“ӨмқҙлӮҳ 섬л§җ мӮ¬лһҢл“ӨмқҖ мӢңлҒ„лҹ¬мӣҢм„ң мһ мқ„ лӘ»мһҳ м§ҖкІҪмқҙлһҖлӢӨ. мӣҢлӮҷ 맹кҪҒмқҙмқҳ мҡёмқҢмқҙ л“ңм„ёкё°лҸ„ н•ҳкұ°лӢҲмҷҖ л°ӨлӮ®мқ„ к°ҖлҰ¬м§Җ м•Ҡкі мҡём–ҙлҢҖкё° л•Ңл¬ёмқҙлӢӨ. л°Өм—җл§Ң мҡ°лҠ”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лӮ®м•„лҸ„ мҡҙлӢӨ.
мҳҲл¶Җн„° лҢҖмһҘ л§Ҳмқ„м—” 맹кҪҒмқҙ мІңм§ҖмҳҖлӢӨ. лҢҖмһҘмқҳ л•…мқҙ лҠҳ мҠөм§Җ(жҝ•ең°)м—җ м –м–ҙ мһҲм–ҙм„ң 맹кҪҒмқҙк°Җ мӮҙкё°м—җлҠ” мөңм Ғмқҳ мЎ°кұҙмқ„ к°–м¶”кі мһҲм—ҲлӢӨ. лІјлҶҚмӮ¬лҘј 짓м§Җ м•ҠмқҖ кіімқҖ к°ҲлҢҖлӮҳ л¶Җл“Өмқҙ мӢ¬м–ҙм ё мһҲм—ҲлӢӨ.
м ҒлӢ№н•ң м–‘мқҳ л¬јмқҙ кі мқҙкі нқҳл ҖлӢӨ. к·ёлҹ¬кё°м—җ 맹кҪҒмқҙл“Өмқҙ мӮҙм•„к°ҖлҠ”лҚ° мқҙл§Ңн•ң мЎ°кұҙмқ„ к°Җ진 кіімқҙ лі„лЎң м—Ҷм—ҲлӢӨ. лҢҖмһҘ л§Ҳмқ„м—җм„ м•„м№Ё м Җл…ҒмңјлЎң л§ҲмЈјм№ҳлҠ” 맹кҪҒмқҙм—җ лҢҖн•ң мӮ¬лһ‘мқҙ м§Җк·№н–ҲлӢӨ. лҸҷл„Ө мӮ¬лһ‘л°©м—җ лӘЁм—¬ 맹кҪҒмқҙ нғҖл №лҸ„ л¶Ҳл ҖлӢӨ.
кІҪкё°лҜјмҡ”лЎң л¶ҖлҘҙлҠ” лҢҖмһҘ л§Ҳмқ„ ‘맹кҪҒмқҙ нғҖл №’мқҙлӢӨ. 1988л…„лҸ„м—җ л°ңк°„н•ң л¶ҖмІңмӢңмӮ¬м—җ мӢӨл Ө мһҲлӢӨ. лҢҖмһҘ мЈјлҜј н•ҳмӨҖнҷҚ(лӮЁ, 74)мңјлЎңл¶Җн„° мұ„лЎқн•ҳмҳҖлӢӨкі лҗҳм–ҙ мһҲлӢӨ.
мқҙл ҮкІҢ 맹кҪҒмқҙ нғҖл №мқҙ мң н–үн• м •лҸ„лЎң лҢҖмһҘ л§Ҳмқ„м—” 맹кҪҒмқҙк°Җ мӮҙкё°м—җ мўӢмқҖ мөңкі мқҳ ліҙкёҲмһҗлҰ¬мҳҖлӢӨ. к·ё м „нҶөмқҙ м§ҖкёҲлҸ„ мқҙм–ҙм§Җкі мһҲлӢӨ.
кёҙл“ұ л§Ҳмқ„кіј кҪғлӢӨлҰ¬ мӮ¬мқҙм—җ мһҲлҠ” мҳӨкіЎмҠөм§Җм—җ к°Җл©ҙ 맹кҪҒмқҙ мІңм§ҖмқҙлӢӨ. лҙ„лӮ мқҙкіім—җ л“ӨлҘҙл©ҙ 맹кҪҒмқҙ мҡёмқҢм—җ к·Җк°Җ лЁ№лЁ№н• м§ҖкІҪмқҙлӢӨ. мҲҳл°ұ, мҲҳмІңмқҳ 맹кҪҒмқҙл“Өмқҙ н•ң лӘ©мҶҢлҰ¬лЎң мҡём–ҙлҢ„лӢӨ. мқҙл“Өмқҙ мқҙл ҮкІҢ мҠөм§ҖлҘј м°Ём§Җн•ҳкі мһҲмңјл©ҙм„ң мғқнғңкі„лҘј кұҙк°•н•ҳкІҢ нӮӨмҡ°кі мһҲлӢӨ. мқҙкіімқҖ мҳҲм „м—җ мӮ¬лһҢл“Өмқҙ мӮҙлҚҳ 집мқҙ лӘЁм—¬ мһҲлҚҳ кіімқҙм—ҲлӢӨ. к№ҖнҸ¬кіөн•ӯм—җм„ң кіЁн”„мһҘмқ„ л§Ңл“ лӢӨлҠ” мқҙмң лЎң мІ кұ°н•ҙлІ„л Ө мҳӨлһ«лҸҷм•Ҳ лІ„л Ө진 л•…, мҰү мҠөм§ҖлЎң 진нҷ”н–ҲлӢӨ.
лӢӨлҘё м§Җм—ӯмқҳ л…јл“Өмқҙ л•…мқ„ лҶ’мқҙ лҸӢмҡ°лҠ” л°”лһҢм—җ мқҙкіімқҖ лӮ®мқҖ м§ҖлҢҖк°Җ лҗҳм—ҲлӢӨ. к·ёлһҳм„ң л¬јмқҙ кі мқҙкі л¬јмқҙ нқҗлҘҙлҠ” лҠӘм§Җк°Җ лҗҳм—ҲлӢӨ. мҳҲм „л¶Җн„° көҙнҸ¬мІңмңјлЎң нқҗлҘҙлҠ” к°ңмҡёмқҙ мһҲм—ҲлӢӨ. мЎ°м„ мӢңлҢҖлӮҳ к·ё нӣ„м—җ кёҙл“ұ л§Ҳмқ„кіј кҪғлӢӨлҰ¬ мӮ¬мқҙм—җ к°ңмҡёмқҙ мһҲм—ҲлӢӨ. кҪғлӢӨлҰ¬мҷҖ лҢҖмһҘ мҙҲл“ұн•ҷкөҗ мӮ°м–ёлҚ• мӮ¬мқҙм—җлҸ„ к°ңмҡёмқҙ мһҲм—ҲлӢӨ. мқҙ л‘җ к°ңмҡёмқҙ н•©міҗм ё көҙнҸ¬мІңмңјлЎң нқҳл ҖлӢӨ.
м§ҖкёҲлҸ„ м ңлІ• н’Қл¶Җн•ң л¬јмқҙ нқҳлҹ¬ лҸҷл¶Җк°„м„ мҲҳлЎң м•„лһҳлҘј нҶөкіј н•ң л’Ө көҙнҸ¬мІңмңјлЎң нқҗлҘёлӢӨ. мқҙкіім—җ кёҲк°ңкө¬лҰ¬, мӨ„мһҘм§ҖлұҖ л“ұмқҳ 비лЎҜн•ң мҲҳл§ҺмқҖ мҲҳмғқ лҸҷл¬ј, мҲҳмғқ мӢқл¬јл“Өмқҳ ліҙкі к°Җ лҗҳм—ҲлӢӨ. л¶Җл“Өмқҙл©° к°ҲлҢҖ, мӨ„ л“ұмңјлЎң мҠөм§ҖлҠ” к°Җл“қ м°Ё мһҲлӢӨ.
н•ҳм§Җл§Ң к№ҖнҸ¬кіөн•ӯ кіЁн”„мһҘмқҙ л“Өм–ҙм„ңл©ҙм„ң мқҙкіімқҳ 맹кҪҒмқҙ, кёҲк°ңкө¬лҰ¬л“ӨмқҖ лҢҖмІҙ мҠөм§ҖлЎң мқҙмӮ¬лҘј н–ҲлӢӨ. 맹кҪҒмқҙлҠ” нҷҳкІҪл¶Җ м§Җм • л©ёмў…мң„кё°мў… 2кёүмқҙлӢӨ. мқҙкіім—җ кіЁн”„мһҘмқ„ 짓기 мң„н•ҙ нҷҳкІҪмҳҒн–ҘнҸүк°ҖлҘј мӢӨмӢңн–ҲлҠ”лҚ°, лҲҲмңјлЎң ліҙмқҙлҠ” 맹кҪҒмқҙн•ҳкі кёҲк°ңкө¬лҰ¬лҠ” мЎ°мӮ¬лҗҳм§Җ м•Ҡм•ҳлӢӨ. нҷҳкІҪмҳҒн–ҘнҸүк°Җм—җм„ң л№ м ё лІ„лҰ° кІғмқҙлӢӨ. мқҙл ҮкІҢ нҷҳкІҪмҳҒн–ҘнҸүк°Җм—җм„ң л№јлІ„лҰ° мқҙмң лҠ” лӢЁ н•ңк°Җм§ҖмҳҖмқ„ кІғмқҙлӢӨ.
кіЁн”„мһҘ кұҙм„Өм—җ кіЁм№ҳ м•„н”Ҳ кІғмқҖ м•„мҳҲ мЎ°мӮ¬м—җм„ң л№јлІ„лҰ¬лҠ” м–„нҢҚн•ң мҲҳлӢЁмқё м…ҲмқҙлӢӨ. 맹кҪҒмқҙлҠ” мқҙл ҮкІҢ мӮөкіј л¬ҙмӮ°мҮ мЎұм ң비, мҲҳлҰ¬л¶Җм—үмқҙ л“ұкіј к°ҷмқҙ мҡ°лҰ¬л“Өмқҙ ліҙнҳён•ҙм•ј н•ҳлҠ” м•„мЈј к·ҖмӨ‘н•ң мЎҙмһ¬мқҙлӢӨ.
맹кҪҒмқҙл“Өмқҙ мқҙмЈјлҘј н•ҙк°„ лӮҜм„ м§‘м—җм„ң мһҳ мӮҙ мҲҳ мһҲлҠ” м§Җ... мһ мқ„ м„Өм№ҳм§ҖлӮҳ м•Ҡмқ„ м§Җ... лЁ№мқҙлҠ” н’Қл¶Җн•ң м§Җ... мҳӨкіЎ мҠөм§Җ м§Җм—ӯм—җлҠ” нҶ нғ„мқҙ н’Қл¶Җн•ҳкІҢ лӮҳлҠ” л•…л“Өмқҙкё°лҸ„ н•ҙм„ң 맹кҪҒмқҙ, кёҲк°ңкө¬лҰ¬мқҳ лЁ№мқҙлҠ” н’Қл¶Җн–ҲлӢӨ. 맹кҪҒмқҙлҠ” к°ңлҜё к°ҷмқҖ мһ‘мқҖ кіӨ충л“Өмқ„ мҰҗкІЁ лЁ№лҠ”лӢӨ.
맹кҪҒмқҙлҠ” м•јн–үм„ұмқҙлӢӨ. лӮ®м—җлҠ” 진нқҷ мҶҚм—җм„ң мһ мқ„ мһҗкұ°лӮҳ нңҙмӢқмқ„ м·Ён•ң л’Өм—җ л°Өм—җ лӮҳмҷҖ лЁ№мқҙмӮ¬лғҘмқ„ н•ңлӢӨ. м ңмқј мўӢм•„н•ҳлҠ” кІғмқҖ 비к°Җ мҳӨлҠ” кІғмқҙлӢӨ. лҙ„лӮ м—җ 비к°Җ мҳӨл©ҙ м¶Өмқ„ 추л©ҙм„ң м§қ짓기м—җ лҸҢмһ…н•ңлӢӨ. м•ҢлӮікё°м—җ м ҒлӢ№н•ң мӣ…лҚ©мқҙк°Җ мғқкё°кё°м—җ л°ҳкё°лҠ” кІғмқҙлӢӨ. л¬ј мҶҚм—җ м•Ңмқ„ лӮім•„ мҳ¬мұҷмқҙк°Җ лҗҳкі мҳ¬мұҷмқҙк°Җ н•ң л§ҲлҰ¬ 맹кҪҒмқҙлЎң м„ұмһҘн•ҙ к°„лӢӨ. к·ёлҹ°лҚ° мқҙ мӣ…лҚ©мқҙк°Җ л§җлқјк°Җл©ҙ мһҗм—°мҠӨлҹҪкІҢ мҳ¬мұҷмқҙмқҳ мғқлӘ…мқҖ л§Ҳк°җн•ңлӢӨ.
맹кҪҒмқҙк°Җ мҷ„м„ұмұ„лЎң м„ұмһҘн•ҙк°Ҳ мҲҳ мһҲлҠ” нҷ•лҘ мқҖ к·№нһҲ лҚ”л””лӢӨ. л°ұ л§ҲлҰ¬м—җм„ң н•ң л‘җл§ҲлҰ¬л§Ңмқҙ мғқмЎҙн•ҙ к°„лӢӨлҠ” л§җмқҙлӢӨ. к·ёл ҮкІҢ мғқмЎҙмқ„ мң„н•ҙ л°ңлІ„л‘Ҙмқ„ м№ҳл©° лҢҖмһҘ л§Ҳмқ„м—җм„ л§№кҪҒмқҙк°Җ мӮҙм•„к°„лӢӨ.
мҳҲм „м—” мқҙкіім—җ к°ңмҡёмқҙ мһҲм–ҙм„ң лӮҳл¬ҙлӢӨлҰ¬(жңЁж©Ӣ)к°Җ лҶ“м—¬м ё мһҲлҚҳ кіімқҙлӢӨ. лҢҖмһҘлҸҷ ліөм§ҖнҡҢкҙҖ мң„мӘҪм—җм„ң к°ңмҡёл¬јмқҙ нқҳлҹ¬лӮҙл ӨмҷҖ кі лҰ¬мҡёлӮҙлЎң н•©лҘҳн–ҲлӢӨ.
|
мЈјм°ЁмһҘ л’Өмј м—җ м•„мЈј мһ‘мқҖ кі лһ‘мқҙ л§Ңл“Өм–ҙм ё мһҲлӢӨ. лӮҳл¬ҙл“ӨлҸ„ мӢ¬м–ҙм ё мһҲм–ҙм„ң мӮ¬лһҢл“Өмқҳ мӢңм„ м—җм„ң лІ—м–ҙлӮ мҲҳ мһҲлӢӨ. нҳёл°•л„қмҝЁмқҙ лӮҳл¬ҙл“Өмқ„ нғҖкі мҳӨлҘҙлҠ” кІғмқ„ м ңмҷён•ҳкі лҠ” лӢӨлҘё кІғл“ӨмқҖ л¬ҙмӢ¬нһҲ к·ём Җ кұ°кё°м—җ мһҲлӢӨ.
мқҙкіі мӣ…лҚ©мқҙм—җм„ң л§Өл…„ лҙ„мқҙл©ҙ 맹кҪҒмқҙмқҳ мҡёл¶Җм§–мқҢмқҙ мӢңмһ‘лҗңлӢӨ. м•”м»·мқ„ м°ҫм•„ лӘ©мІӯ н„°м ёлқј мҷём№ҳлҠ” 맹кҪҒмқҙл“Өмқҳ мІҳм Ҳн•ң мӮ¬нҲ¬к°Җ мӢңмһ‘лҗҳлҠ” кІғмқҙлӢӨ.
м§Җк·№нһҲ мўҒмқҖ кіөк°„м—җм„ң м•”м»· н•ҳлӮҳлҘј л‘җкі лЁјм Җ м°Ём§Җн•ҳкё° мң„н•ҙ л§№л ¬н•ҳкІҢ мҡёмқҢмқ„ мҡём–ҙлҢҖлҠ” кІғмқҙлӢӨ. м•„лӢҲ м•”м»·мқ„ л¶ҖлҘҙлҠ” мӮ¬лһ‘мқҳ мҶЎк°Җ(й ҢжӯҢ), мӮ¬лһ‘мқҳ м„ёл ҲлӮҳлҚ°мқҙлӢӨ.
|
мқҙл ҮкІҢ к·ңм№ҷм ҒмңјлЎң мҡём§Җ м•ҠлҠ”лӢӨ. мҲҳм»· н•ң лҶҲмқҙ 맹맹 кұ°лҰ¬л©° мҡҙлӢӨ. к·ёлҹ¬л©ҙ кіҒм—җ мһҲлҠ” лҶҲл“ӨлҸ„ мқҙм—җ л’Өм§Ҳм„ёлқј 맹맹 кұ°лҰ¬л©° мҡҙлӢӨ. н•ң лҶҲмқҙ кҪҒкҪҒмңјлЎң мҡёмқҢмқҳ мқҢмқ„ л°”кҫјлӢӨ. м•”м»·мқ„ мң нҳ№н•ҳкё° мң„н•ҙ лӢӨм–‘н•ң мҡёмқҢмңјлЎң лӢӨк°Җм„ңлҠ” кІғмқҙлӢӨ. к·ёлҹ¬л©ҙ м§ҖмІҙм—Ҷмқҙ лӢӨлҘё лҶҲл“ӨлҸ„ кҪҒкҪҒкұ°лҰ°лӢӨ. мқҙл ҮкІҢ 맹맹과 кҪҒкҪҒмқ„ лІҲк°Ҳм•„к°Җл©° л°ӨмғҲмӣҢ мҡҙлӢӨ. м№ҳм—ҙн•ң мӮ¬лһ‘мӢёмӣҖмқҙлӢӨ.
мЎ°м„ мӢңлҢҖ л•Ңмқҳ 맹мһҗ мҷҲ кіөмһҗ мҷҲ мұ… мқҪлҠ” мҶҢлҰ¬мҷҖ лҳ‘к°ҷлӢӨ. л§Ҳмқ„л§ҲлӢӨ м–‘л°ҳ집м—җм„ңлҠ” мқҙл ҮкІҢ 맹кҪҒмқҙмІҳлҹј мұ… мқҪлҠ” мҶҢлҰ¬к°Җ мҡ”лһҖн–ҲлӢӨ. 맹кҪҒмқҙ м„ңлӢ№мқҙлқјлҠ” л§җмқҙ кҙңнһҲ мғқкІЁлӮң кІғмқҖ м•„лӢҲлӢӨ. 맹кҪҒмқҙмІҳлҹј мҷҒмһҗм§Җк»„н•ҳкІҢ кёҖмқ„ мқҪм—Ҳкё°м—җ к·ёкұё н’Қмһҗн•ҙм„ң мғқкІЁлӮң кІғмқҙм—ҲлӢӨ. м„ңлҜјл“Өмқҙм•ј н•ҳлЈЁ мқјкіјмқҳ н”јкіӨм—җ кіЁм•„ л–Ём–ҙм ё м„ёмғҒлӘЁлҘҙкі кҝҲлӮҳлқјлҘј н—Өл§Өм—Ҳмқ„ н„°мқҙм§Җл§Ң...
лҙ„мқҙл©ҙ лҢҖмһҘ л§Ҳмқ„ мӮ¬лһҢл“ӨмқҙлӮҳ 섬л§җ мӮ¬лһҢл“ӨмқҖ мӢңлҒ„лҹ¬мӣҢм„ң мһ мқ„ лӘ»мһҳ м§ҖкІҪмқҙлһҖлӢӨ. мӣҢлӮҷ 맹кҪҒмқҙмқҳ мҡёмқҢмқҙ л“ңм„ёкё°лҸ„ н•ҳкұ°лӢҲмҷҖ л°ӨлӮ®мқ„ к°ҖлҰ¬м§Җ м•Ҡкі мҡём–ҙлҢҖкё° л•Ңл¬ёмқҙлӢӨ. л°Өм—җл§Ң мҡ°лҠ”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лӮ®м•„лҸ„ мҡҙлӢӨ.
мҳҲл¶Җн„° лҢҖмһҘ л§Ҳмқ„м—” 맹кҪҒмқҙ мІңм§ҖмҳҖлӢӨ. лҢҖмһҘмқҳ л•…мқҙ лҠҳ мҠөм§Җ(жҝ•ең°)м—җ м –м–ҙ мһҲм–ҙм„ң 맹кҪҒмқҙк°Җ мӮҙкё°м—җлҠ” мөңм Ғмқҳ мЎ°кұҙмқ„ к°–м¶”кі мһҲм—ҲлӢӨ. лІјлҶҚмӮ¬лҘј 짓м§Җ м•ҠмқҖ кіімқҖ к°ҲлҢҖлӮҳ л¶Җл“Өмқҙ мӢ¬м–ҙм ё мһҲм—ҲлӢӨ.
м ҒлӢ№н•ң м–‘мқҳ л¬јмқҙ кі мқҙкі нқҳл ҖлӢӨ. к·ёлҹ¬кё°м—җ 맹кҪҒмқҙл“Өмқҙ мӮҙм•„к°ҖлҠ”лҚ° мқҙл§Ңн•ң мЎ°кұҙмқ„ к°Җ진 кіімқҙ лі„лЎң м—Ҷм—ҲлӢӨ. лҢҖмһҘ л§Ҳмқ„м—җм„ м•„м№Ё м Җл…ҒмңјлЎң л§ҲмЈјм№ҳлҠ” 맹кҪҒмқҙм—җ лҢҖн•ң мӮ¬лһ‘мқҙ м§Җк·№н–ҲлӢӨ. лҸҷл„Ө мӮ¬лһ‘л°©м—җ лӘЁм—¬ 맹кҪҒмқҙ нғҖл №лҸ„ л¶Ҳл ҖлӢӨ.
| лҢҖмһҘлҸҷ 맹кҪҒмқҙ нғҖл № м–Ҫкі лҸ„ кІҖкі лӮ®кІҢ м•үмқҖ л§ӨлҜё мһҘлҺ…мқҙ к°ҷкі л©Қм„қ л–Ўм„қ л–Ўм„қ к°ҷкі мҡ°л°• л§һмқҖ мһ¬нғңлҜё к°ҷкі к·ё н—ҲлҰ¬лҘј мҚ© лӮҙлӢ¬м•„ мҷҖ мҷ•мӢӯлҰ¬ л‘ҳм§ё 집мқ„ мҡёкі лӮҳлҠ” 맹кҪҒмқҙк°Җ мІ« лӮЁнҺёмқ„ мқҙлі„н•ҳкі л‘ҳм§ё лӮЁнҺёмқ„ м–»м—ҲлҚ”лӢҲ мҶҗнҶұмқҙ м§Ҳм–ҙм„ң к°җмҳҘмҶҢ к°Җкі м…Ӣм§ё лӮЁнҺёмқ„ м–»м—ҲлҚ”лӢҲ м№ мӣ” мһҘл§Ҳн„°м—җ 배추 мһҺмӮ¬к·Җм—җ л№ м ё мЈҪм—Ҳкё°лЎң кі—лҸҲ м°ҫм•„лҹ¬ к°ҖлҠ” 맹кҪҒмқҙм—¬лқјм„ё к·ё мӨ‘м—җ нҷҖм• л№„ 맹кҪҒмқҙ к·ё кјҙмқ„ ліҙкі лӮҳн•ҳкі мӮҙмһҗкі м°ҢкҝҚ м§ңк¶Ғ мһЎм•„лӢӨлӢҲ л§ӣмқҙлӮҳ лҙҗлқјкі мңјмҠҘ н•ңлІҲ мһЎм•„ліҙлӢҲ кө¬мһҘмІңм—җ мҡ©лҸҲ лӢ¬лһҳл“Ҝ н•ҳл„Ө м—җмқҙмҡ” лҚ°мқҙмҡ” м—җмқҙмҡ” лҚ°мқҙмҡ” мҳӨлүҙмӣ”мқҙлқј лӢЁмҳӨмқј мҶЎл°ұмҲҷ н‘ёлҘёк°Җм§Җ лҶ’лӢӨлһ—кІҢ л–Ўл“ңлқјлӢҲ к·ёл„ӨлҘј л§Өкі л…№мқҳ нҷҚмғҒ лӢҳл“ӨмқҖ мҳӨлқҪк°ҖлқҪм—җ мӨ‘мІңмқ„ лӢӨ н•ҳл„Ө м—җн—Өмқҙмҡ” м—җн—Өмқҙлқј кҙ‘кІҪмқҙлЎңлӢӨ. |
кІҪкё°лҜјмҡ”лЎң л¶ҖлҘҙлҠ” лҢҖмһҘ л§Ҳмқ„ ‘맹кҪҒмқҙ нғҖл №’мқҙлӢӨ. 1988л…„лҸ„м—җ л°ңк°„н•ң л¶ҖмІңмӢңмӮ¬м—җ мӢӨл Ө мһҲлӢӨ. лҢҖмһҘ мЈјлҜј н•ҳмӨҖнҷҚ(лӮЁ, 74)мңјлЎңл¶Җн„° мұ„лЎқн•ҳмҳҖлӢӨкі лҗҳм–ҙ мһҲлӢӨ.
мқҙл ҮкІҢ 맹кҪҒмқҙ нғҖл №мқҙ мң н–үн• м •лҸ„лЎң лҢҖмһҘ л§Ҳмқ„м—” 맹кҪҒмқҙк°Җ мӮҙкё°м—җ мўӢмқҖ мөңкі мқҳ ліҙкёҲмһҗлҰ¬мҳҖлӢӨ. к·ё м „нҶөмқҙ м§ҖкёҲлҸ„ мқҙм–ҙм§Җкі мһҲлӢӨ.
кёҙл“ұ л§Ҳмқ„кіј кҪғлӢӨлҰ¬ мӮ¬мқҙм—җ мһҲлҠ” мҳӨкіЎмҠөм§Җм—җ к°Җл©ҙ 맹кҪҒмқҙ мІңм§ҖмқҙлӢӨ. лҙ„лӮ мқҙкіім—җ л“ӨлҘҙл©ҙ 맹кҪҒмқҙ мҡёмқҢм—җ к·Җк°Җ лЁ№лЁ№н• м§ҖкІҪмқҙлӢӨ. мҲҳл°ұ, мҲҳмІңмқҳ 맹кҪҒмқҙл“Өмқҙ н•ң лӘ©мҶҢлҰ¬лЎң мҡём–ҙлҢ„лӢӨ. мқҙл“Өмқҙ мқҙл ҮкІҢ мҠөм§ҖлҘј м°Ём§Җн•ҳкі мһҲмңјл©ҙм„ң мғқнғңкі„лҘј кұҙк°•н•ҳкІҢ нӮӨмҡ°кі мһҲлӢӨ. мқҙкіімқҖ мҳҲм „м—җ мӮ¬лһҢл“Өмқҙ мӮҙлҚҳ 집мқҙ лӘЁм—¬ мһҲлҚҳ кіімқҙм—ҲлӢӨ. к№ҖнҸ¬кіөн•ӯм—җм„ң кіЁн”„мһҘмқ„ л§Ңл“ лӢӨлҠ” мқҙмң лЎң мІ кұ°н•ҙлІ„л Ө мҳӨлһ«лҸҷм•Ҳ лІ„л Ө진 л•…, мҰү мҠөм§ҖлЎң 진нҷ”н–ҲлӢӨ.
лӢӨлҘё м§Җм—ӯмқҳ л…јл“Өмқҙ л•…мқ„ лҶ’мқҙ лҸӢмҡ°лҠ” л°”лһҢм—җ мқҙкіімқҖ лӮ®мқҖ м§ҖлҢҖк°Җ лҗҳм—ҲлӢӨ. к·ёлһҳм„ң л¬јмқҙ кі мқҙкі л¬јмқҙ нқҗлҘҙлҠ” лҠӘм§Җк°Җ лҗҳм—ҲлӢӨ. мҳҲм „л¶Җн„° көҙнҸ¬мІңмңјлЎң нқҗлҘҙлҠ” к°ңмҡёмқҙ мһҲм—ҲлӢӨ. мЎ°м„ мӢңлҢҖлӮҳ к·ё нӣ„м—җ кёҙл“ұ л§Ҳмқ„кіј кҪғлӢӨлҰ¬ мӮ¬мқҙм—җ к°ңмҡёмқҙ мһҲм—ҲлӢӨ. кҪғлӢӨлҰ¬мҷҖ лҢҖмһҘ мҙҲл“ұн•ҷкөҗ мӮ°м–ёлҚ• мӮ¬мқҙм—җлҸ„ к°ңмҡёмқҙ мһҲм—ҲлӢӨ. мқҙ л‘җ к°ңмҡёмқҙ н•©міҗм ё көҙнҸ¬мІңмңјлЎң нқҳл ҖлӢӨ.
м§ҖкёҲлҸ„ м ңлІ• н’Қл¶Җн•ң л¬јмқҙ нқҳлҹ¬ лҸҷл¶Җк°„м„ мҲҳлЎң м•„лһҳлҘј нҶөкіј н•ң л’Ө көҙнҸ¬мІңмңјлЎң нқҗлҘёлӢӨ. мқҙкіім—җ кёҲк°ңкө¬лҰ¬, мӨ„мһҘм§ҖлұҖ л“ұмқҳ 비лЎҜн•ң мҲҳл§ҺмқҖ мҲҳмғқ лҸҷл¬ј, мҲҳмғқ мӢқл¬јл“Өмқҳ ліҙкі к°Җ лҗҳм—ҲлӢӨ. л¶Җл“Өмқҙл©° к°ҲлҢҖ, мӨ„ л“ұмңјлЎң мҠөм§ҖлҠ” к°Җл“қ м°Ё мһҲлӢӨ.
|
н•ҳм§Җл§Ң к№ҖнҸ¬кіөн•ӯ кіЁн”„мһҘмқҙ л“Өм–ҙм„ңл©ҙм„ң мқҙкіімқҳ 맹кҪҒмқҙ, кёҲк°ңкө¬лҰ¬л“ӨмқҖ лҢҖмІҙ мҠөм§ҖлЎң мқҙмӮ¬лҘј н–ҲлӢӨ. 맹кҪҒмқҙлҠ” нҷҳкІҪл¶Җ м§Җм • л©ёмў…мң„кё°мў… 2кёүмқҙлӢӨ. мқҙкіім—җ кіЁн”„мһҘмқ„ 짓기 мң„н•ҙ нҷҳкІҪмҳҒн–ҘнҸүк°ҖлҘј мӢӨмӢңн–ҲлҠ”лҚ°, лҲҲмңјлЎң ліҙмқҙлҠ” 맹кҪҒмқҙн•ҳкі кёҲк°ңкө¬лҰ¬лҠ” мЎ°мӮ¬лҗҳм§Җ м•Ҡм•ҳлӢӨ. нҷҳкІҪмҳҒн–ҘнҸүк°Җм—җм„ң л№ м ё лІ„лҰ° кІғмқҙлӢӨ. мқҙл ҮкІҢ нҷҳкІҪмҳҒн–ҘнҸүк°Җм—җм„ң л№јлІ„лҰ° мқҙмң лҠ” лӢЁ н•ңк°Җм§ҖмҳҖмқ„ кІғмқҙлӢӨ.
кіЁн”„мһҘ кұҙм„Өм—җ кіЁм№ҳ м•„н”Ҳ кІғмқҖ м•„мҳҲ мЎ°мӮ¬м—җм„ң л№јлІ„лҰ¬лҠ” м–„нҢҚн•ң мҲҳлӢЁмқё м…ҲмқҙлӢӨ. 맹кҪҒмқҙлҠ” мқҙл ҮкІҢ мӮөкіј л¬ҙмӮ°мҮ мЎұм ң비, мҲҳлҰ¬л¶Җм—үмқҙ л“ұкіј к°ҷмқҙ мҡ°лҰ¬л“Өмқҙ ліҙнҳён•ҙм•ј н•ҳлҠ” м•„мЈј к·ҖмӨ‘н•ң мЎҙмһ¬мқҙлӢӨ.
맹кҪҒмқҙл“Өмқҙ мқҙмЈјлҘј н•ҙк°„ лӮҜм„ м§‘м—җм„ң мһҳ мӮҙ мҲҳ мһҲлҠ” м§Җ... мһ мқ„ м„Өм№ҳм§ҖлӮҳ м•Ҡмқ„ м§Җ... лЁ№мқҙлҠ” н’Қл¶Җн•ң м§Җ... мҳӨкіЎ мҠөм§Җ м§Җм—ӯм—җлҠ” нҶ нғ„мқҙ н’Қл¶Җн•ҳкІҢ лӮҳлҠ” л•…л“Өмқҙкё°лҸ„ н•ҙм„ң 맹кҪҒмқҙ, кёҲк°ңкө¬лҰ¬мқҳ лЁ№мқҙлҠ” н’Қл¶Җн–ҲлӢӨ. 맹кҪҒмқҙлҠ” к°ңлҜё к°ҷмқҖ мһ‘мқҖ кіӨ충л“Өмқ„ мҰҗкІЁ лЁ№лҠ”лӢӨ.
맹кҪҒмқҙлҠ” м•јн–үм„ұмқҙлӢӨ. лӮ®м—җлҠ” 진нқҷ мҶҚм—җм„ң мһ мқ„ мһҗкұ°лӮҳ нңҙмӢқмқ„ м·Ён•ң л’Өм—җ л°Өм—җ лӮҳмҷҖ лЁ№мқҙмӮ¬лғҘмқ„ н•ңлӢӨ. м ңмқј мўӢм•„н•ҳлҠ” кІғмқҖ 비к°Җ мҳӨлҠ” кІғмқҙлӢӨ. лҙ„лӮ м—җ 비к°Җ мҳӨл©ҙ м¶Өмқ„ 추л©ҙм„ң м§қ짓기м—җ лҸҢмһ…н•ңлӢӨ. м•ҢлӮікё°м—җ м ҒлӢ№н•ң мӣ…лҚ©мқҙк°Җ мғқкё°кё°м—җ л°ҳкё°лҠ” кІғмқҙлӢӨ. л¬ј мҶҚм—җ м•Ңмқ„ лӮім•„ мҳ¬мұҷмқҙк°Җ лҗҳкі мҳ¬мұҷмқҙк°Җ н•ң л§ҲлҰ¬ 맹кҪҒмқҙлЎң м„ұмһҘн•ҙ к°„лӢӨ. к·ёлҹ°лҚ° мқҙ мӣ…лҚ©мқҙк°Җ л§җлқјк°Җл©ҙ мһҗм—°мҠӨлҹҪкІҢ мҳ¬мұҷмқҙмқҳ мғқлӘ…мқҖ л§Ҳк°җн•ңлӢӨ.
맹кҪҒмқҙк°Җ мҷ„м„ұмұ„лЎң м„ұмһҘн•ҙк°Ҳ мҲҳ мһҲлҠ” нҷ•лҘ мқҖ к·№нһҲ лҚ”л””лӢӨ. л°ұ л§ҲлҰ¬м—җм„ң н•ң л‘җл§ҲлҰ¬л§Ңмқҙ мғқмЎҙн•ҙ к°„лӢӨлҠ” л§җмқҙлӢӨ. к·ёл ҮкІҢ мғқмЎҙмқ„ мң„н•ҙ л°ңлІ„л‘Ҙмқ„ м№ҳл©° лҢҖмһҘ л§Ҳмқ„м—җм„ л§№кҪҒмқҙк°Җ мӮҙм•„к°„лӢӨ.
н•ңлҸ„нӣҲ
<м Җмһ‘к¶Ңмһҗ мқҙмқҢн”Ңлҹ¬мҠӨлүҙмҠӨ л¬ҙлӢЁм „мһ¬ л°Ҹ мһ¬л°°нҸ¬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