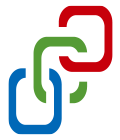다이빙 금지 표시, 수심 표시, 접근 차단 조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의 미흡함이 인정
“이용자의 부주의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어디까지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
이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영장을 운영한 펜션 측의 안전관리 책임은 없었던 걸까요? 법원은 이 사고에 대해 A 본인의 책임을 90%로, 펜션 측의 책임을 10%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이용자의 자기책임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세의 청년 A는 2020년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에 투숙 중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펜션에 설치된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펜션 운영자인 B를 상대로 수영장의 안전관리 책임, 즉 수심 표시 미비, 다이빙 금지 경고 부족, 야간 안전 조치 부재 등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16억 9952만 원과 위자료를 포함하는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2023가합109549). “해당 수영장의 높이상 다이빙 자세로 입수할 경우 신체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B는 사전에 이용객이 다이빙을 못하게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만들어 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사고 당시 수영장 수영풀 안쪽 벽면에 다이빙 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가 별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수영풀 제품에 접착된 작은 크기의 제품 안내표시에 불과하고 위치나 크기를 보면 이용객들이 이를 야간에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수심 표기는 없었다.”
“야간에 수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 등을 씌워 이용을 제지하지 않았다. B는 ‘밤에 출입계단을 막아놨는데도 A가 무리하게 넘어가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울타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용객들이 수영풀 이용 시 보행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풀 높이에 맞춰 연접해 설치해 둔 목재 데크 부분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물이 아니고 높이도 손으로 짚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여서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16억 9952만여 원으로 보고, 이 중 피고는 10%인 1억 6995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한 1억 7995만여 원을 지급하라.”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설물의 하자 및 안전조치 미비는 법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다이빙 금지 표시, 수심 표시, 접근 차단 조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의 미흡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이용자의 자기책임 원칙 또한 중요합니다.
A는 성인으로서 다이빙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그의 과실 비율을 90%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펜션 측의 배상책임은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되었고,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7천9백여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의의무’와 ‘자기책임’ 사이의 법적 경계를 되묻게 하는 판결입니다. 펜션 운영자로서 피고는 ‘수영장이 야간에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는지’, ‘다이빙 금지 표시가 이용객에게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는지’, ‘수심이 적절히 고지되어 있었는지’ 등 안전배려의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수영장은 어두웠고, 수심 표기나 경고 표시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접근 통제 시설도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사고를 당한 A 역시 성인으로서 다이빙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됩니다.
다만 새벽 4시라는 시간대와 시야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시설의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에게 본인의 책임을 90%나 묻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높은 본인 과실 비율을 인정한 것은 ‘개인의 무리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취지일 수 있으나, 동시에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안전관리 책임이 과소평가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영장 사고가 빈번한 시기에는 시설 운영자의 사전 예방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이번 판결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이용자의 부주의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어디까지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음플러스뉴스
<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